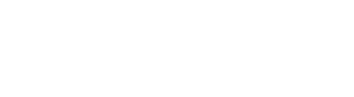무진 세월 견뎌온 돌섬···어떻게 살까 해도 살더라...
무진 세월 견뎌온 돌섬···어떻게 살까 해도 살더라[감성여행] 국토 서남 끝섬 가거도 멸치잡이 노랫소리, 갯밭 아낙네 무레질에도 끈질긴 희망 담겨 대한민국 끝섬을 찾아 나서는 일은 고단하다. 가는 길이 멀어 편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가거도는 여정의 고단함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곳곳에 숨겨진 비경을 만날 때마다 감동을 안겨준다. 기괴한 절경으로 남성미를 풍기는 독실산은 가거도를 찾아온 낯선 방문객에게도 거칠지만 따뜻한 손을 내민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에 도착한 쾌속선이 잠시 호흡을 가다듬듯 멈췄다. 바람에 닫혔던 뱃길이 열려서인지 승객도 제법 많았다. 그리고 다시 두어 시간을 달려 하태도에 이르렀다. 배가 한 시간쯤 더 달리자 우뚝 솟은 돌섬이 보인다. 봉우리는 독실산이다. 다도해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망망대해에서 수천 년 동안 거친 파도를 견뎌낸 모습이 경이롭다. 돌이 실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더 놀라운 것은 선사시대부터 그곳에 사람이 살았다는 것이다. 짐을 풀어놓자마자 낚싯배에 올랐다. 가거도 등대를 찾아 나섰다. 등대에는 섬에 처음 들어와 산 사람들의 흔적이 있다. 등대 이름은 ‘소흑산도 등대’다. 1905년에 지어 1907년 점등했다. 무인등대로 시작했지만 통행 선박이 많아지자 1935년 유인등대로 바뀌었다. 가거도 ‘가고, 보이니까 가는 섬’ 등대 아래 선창에 배를 정박하고 가파른 계단을 오른다. 등탑이 보일 무렵 걸음을 멈췄다. 계단과 잡목 사이 절개지에 하얗게 반짝거리는 조개 껍질들이 보인다. 조개무지였다.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사용한 토기와 뼈로 만든 도구들이 함께 발견됐다고 한다. 장보고 선단이 한·중·일 중계무역을 하면서 쉬어가던 곳이라고도 한다. 쾌속선으로 달려도 먼 뱃길인데, 그 옛날 노를 젓고 바람에 의지해 이곳까지 들어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시인 조태일은 ‘가거도(可居島)’에서 ‘있는지조차 / 없는지조차 모르는 섬’이지만 ‘우리 한민족 무지렁이들은 가고, 보이니까 가고, 보이니까 또 가서 마침내 살 만한 곳’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가거도라고 했을까? 가는 길이 힘들어도 섬에 들면 그 괴로움은 까맣게 잊는다.
가거도 등대 맞은편에는 작은 무인도가 있다. 바다제비와 슴새(무인도에만 서식하는 새)들의 천국인 국흘도와 개린도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가 늦게 지는 곳으로, 일몰이 장관이다. 고집스럽게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불을 밝히는 갓섬의 등대가 새삼 대견스럽게 보였다. 무레질로 미역을 뜯는 상무레꾼 머나먼 섬에 정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의문은 의외로 쉽게 풀렸다. 미역을 채취하러 가는 섬사람 임씨 부부를 만나 배를 얻어 탔다. 미역은 가거도·만재도·태도(상태·중태·하태) 등 흑산권역에서 섬사람들의 생계와 생활을 책임지는 해조류다. 회룡산을 빠져나가자 잠시 뒤뚱거리던 배가 이내 자리를 잡는다. 배 안에는 임씨 부부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 조씨가 타고 있었다. 조씨는 가거도의 몇 안 되는 상무레꾼(해녀)이다. 태생이 가거도 출신인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가거도 사람들은 갯밭에서 미역과 톳·우뭇가사리·김 등을 채취해 생활한다. 갯밭은 간단한 도구나 맨손을 이용해 물이 빠진 갯바위나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조간대를 말한다. 임씨 부부가 간여가 보이는 ‘현철이 밭밑’에서 배를 멈췄다. 가거도는 작은 여와 갯바위마다 모두 이름이 있다. 한때 섬사람들의 삶을 책임졌던 갯바위들이기 때문이다. 임씨와 조씨 두 여인은 두름박과 홍서리를 바다에 던지더니 한 손에 낫을 쥐고 바닷물로 뛰어들었다. 가거도의 미역밭은 대리마을의 동구 과 서구 ·대풍리 ·항리 네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별로 공동작업을 해서 채취한 미역을 똑같이 나눈다. 미역이 식량이자 목숨이기에 이를 엄격하게 관리한다. 지난해, 겨울로 들어서는 길목에 동행들과 함께 가거도를 다시 찾았다. 저녁을 일찍 먹고 나자 모둠별로 작은 술자리가 마련됐다. 술 몇 잔을 마신 후 혼자 조용히 자리를 빠져 나왔다. 낮에 선창에서 조기를 따던 뱃사람들은 작업이 끝나지 않았는지 불을 밝히고 있다. 빗줄기가 제법 굵다. 수은등 아래 비옷으로 무장한 여섯 명의 남자가 조기를 따며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 조기배 선주들은 대부분 목포사람이다. 가거도에도 배가 있지만 불볼락 등 섬 주변에서 주낙을 하거나 홍합을 따는 정도에 그친다. 조기잡이는 흑산도에서 추자도 방향으로 더 멀리 나가 조업한다. 자망에 걸린 조기를 배에 싣고 와 선창에서 따는 것이다. 그리고 그물을 손질해 다시 어장으로 나간다. 잡은 조기는 크기별로 선별해 목포로 보낸다. 섬사람들은 한때 바위틈에 보리와 고구마를 심어 식량으로 삼았다. 지금은 그곳에 후박나무가 심어져 있다. 대리에서 항리로 넘어가는 비탈진 곳도 전부 밭이었다. 1960년대 가거도의 섬살이는 미역과 멸치에 의존했다. ‘멸치잡이 못하면 병신’이라고 할 정도로 멸치잡이 선단(챗배)에 끼이지 못하면 밥 먹고 살기 어려웠다. 노 젓는 소리에 담긴 섬살이 배를 타지 않고는 갯밭에 나갈 수도 없었다. 산이 험하고 가팔라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남자는 물론 여자들도 노를 젓거나 무레질을 할 줄 모르면 굶어 죽을 형편이었다. 그래서 무레꾼의 노젓는 소리(놋소리)에는 ‘정드는 님을 놈 주믄 놈 줏제’ ‘노착(노를 드리웠을 때 물 위로 나오는 손 잡는 부분)을 놈 줄소냐’라며 노를 남에게 줄 수 없다는 대목이 나온다. 그만큼 노가 중요했다. 대리에서 국흘도나 오동여 등 상무레꾼만 채취가 가능한 곳까지 가려면 한 시간 이상 노를 저어야 한다. 노 젓는 소리를 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 멸치잡이 노래도 마찬가지다. 삶이 만들어 낸 노랫소리다. 그 중 멸치잡이 노래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가거도 사람들은 봄에 미역을 뜯고, 가을에는 멸치를 잡았다. 미역을 말리고, 멸치는 젓을 담가 식량과 바꾸었다. 목포에 있는 건어물상회로 보내기도 하고,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직접 배에 싣고 섬을 돌며 판매하기도 했다. 이를 ‘섬돌이’라고 한다.
그 사이 여자들은 집안 살림을 하면서 갯밭에서 반찬거리를 구하고 돌산을 일궈 농사를 지었다. 여자들은 “밥 담은 대롱개는 서울기굉을 하는데…”라며 신세한탄을 했다. 대롱개는 도시락을 일컫는다. 여자로 태어난 신세가 대롱개만 못하다는 것이다. 1960년대 중반 한 신문에는 가거도에 대해 “여자가 밭일·집일 등을 하고 남자는 고기잡이 외에는 일하지 않아 남자가 나무 등을 하면 마을여자들이 그 부인을 나무라는 관습이 있다”고 나와 있다. 1980년대 후박나무 붐이 일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값싼 중국산 후박나무가 들어오자 벌목으로는 더 이상 생계를 책임질 수 없게 됐다. 끝섬에 새로운 희망을 걸다 처음부터 남성들이 벌목을 했던 것은 아니다. 미역이 섬 살림에서 귀중하게 여겨지던 시절에는 남성 무레꾼이 많았다. 여자들은 무레질을 하지 못하는 집에 품을 팔러 가거나 남자들이 채취해온 미역을 갈무리해 건조하는 일을 맡았다. 가거도 바다가 거칠고 수심이 깊어 힘 좋고 호흡이 긴 남자들이 무레질을 많이 했다. 여성들이 갯밭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방파제 공사가 시작되면서 남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 후부터다. 남자들은 무레질을 하지 않아도 가장 구실을 할 수 있었다. 이후 갯밭은 여자들 차지가 되었다. 멸치잡이와 미역 채취, 조기잡이는 더 이상 섬살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예전에 비해 뱃길이 조금 수월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먼 길이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 국토 끝섬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제 겨우 연 2,000여 명의 외지인이 가거도를 찾는다. 가거도는 500명의 주민들만 지켜야 할 섬이 아니다. 끝섬이 갓섬 사람들이 갯밭과 섬을 가꾸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글과 사진·김준(목포대 교수)
[위클리공감] |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