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숙사에서 끓인 만둣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설] 내 기억에 남은 설②
이원복(만화가·덕성여대 교수)
 |
| 이원복(만화가·덕성여대 교수) |
나는 교수가 귀찮아할 정도로 집요하게 궁금증을 풀어갔다. 시간이 나면 도서관에서 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며 지적 갈증을 풀었다.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 한국사람은 아예 만나지 않았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한 해가 흘렀다. 그리고 설을 맞이했다.
태어나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흔들린 기억이 없었다. 하지만 독일에서 홀로 맞이한 설은 묘한 감정을 불러왔다. 외로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가 한 상 가득 차려주시는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이 머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정겨운 친지를 만나 어울리고 싶은 느낌을 도저히 떨칠 수 없었다. 1982년 뮌스터대 기숙사에서 홀로 앉아 맞이한 설은 참 우울했다. 이메일은커녕 전화 한 통 걸기도 어렵던 시절이다. 방법을 찾아야 했다. 같은 기숙사에 한국학생이 한 명 있었다. 평소에는 소 닭 보듯 지내던 사이였다. 이름도 몰랐다. 지금도 역시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다. 하지만 어떤가? 민족의 대명절 설이었다. 한민족이라면 함께 어울려야 하지 않겠는가? 찾아가 말을 걸었다. 같이 만둣국을 끓여먹자고. 멀뚱히 쳐다보던 그가 대답했다.
“그럽시다.”
가까운 독일 편의점으로 갔다. 밀가루·돼지고기·쇠뼈·야채·마늘 등을 챙겼다. 오는 길에는 한인마트에 들러 참기름과 간장을 챙겼다. 기숙사에 오자마자 식당으로 향했다. 독일인의 식단은 단순하다. 학생들은 더더욱 간편하다. 샌드위치에 우유 한 잔. 저녁에는 소시지에 맥주 한 잔이 전부다. 커다란 냄비에 쇠뼈를 넣고 물을 부었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학생은 우리뿐이었다. 5시간 정도 팔팔 끓였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투덜거리는 학생이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독일인은 문화적 차이에 대해 대단히 관대한 편이다. 공식적으로 그렇다. 뒷담화를 나누겠지만 어쩌겠는가? 민족의 대명절을 보내기 위해 우리는 만둣국을 끓여야 했다.
육수가 만들어지는 동안 밀가루를 반죽했다. 만두를 만드는 과정에서 맥주병과 물컵의 활약이 컸다. 맥주병으로 얇게 개어 놓은 반죽에 물컵을 지긋이 누르면 동그란 만두피가 찍혀 나온다. 여기에 다진 돼지고기와 잘게 썰어 놓은 잡다한 야채, 으깬 마늘과 두부를 골고루 섞은 만두 속을 채워 넣었다. 묘한 조합이었지만 두어 스푼 담아 넣은 참기름으로 맛을 내기에 충분했다.
얼굴 곳곳에 밀가루를 묻혀가며 만두를 빚었다. 식탁 한 가득 만두가 쌓였다. 냄비에 물을 붓고 정성껏 준비한 육수에 만두를 넣어 끓였다. 달랑 만두 몇 개 둥둥 떠 있는 만둣국이었지만 A학점 맞은 것만큼 뿌듯했다. 우리가 기숙사 식당을 점거한 지 일곱 시간 만의 쾌거였다.
내가 1946년생이니 올해 설은 예순일곱 번째 맞는 설이다. 유학시절 독일에서 보낸 설은 내게 많은 것을 깨우쳐줬다. 고향·친구·그리움,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이다. 따뜻한 음식은 내게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이를 나이 먹고 독일에 가서야 알았던 것이다.
[위클리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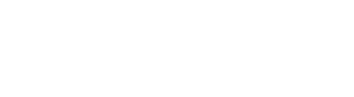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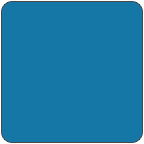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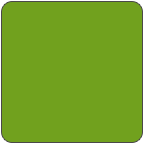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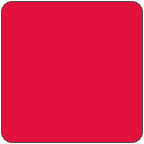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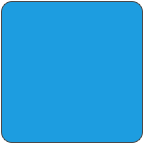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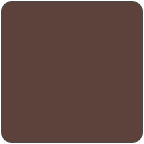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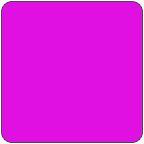

 페이스북
페이스북
 트위터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네이버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