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이 돼 자리에서 물러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그 자리에 새로 임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7·23기) 인사가 화제를 모았다. 이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자리가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2004년 2월 서울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의정부 등 5개 지원과 지청이 지방검찰청으로 승격됐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바뀌었다.
2005년부터 서울중앙지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존 검사장급에서 고등검사장급 보직으로 격상했다. 일선 지검장 중 유일하게 고검장급이었다.
2013년 4월 대규모 권력형 비리와 정치인, 대기업 등 비리수사를 전담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되자 서울중앙지검은 특수·공안·형사사건을 지휘하는 검찰 사정수사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전 지검장의 경우 2015년 12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롯데그룹 비리 수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런 상징성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차기 총장 후보로도 꼽히는 자리다. 최근 자리에서 물러난 김수남 전 검찰총장(58·16기) 역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다.
하지만 전국 최대 수사기관이라는 위치에 있는 만큼 검찰 안팎의 집중공격을 받는 대상이 되기도 했다. 특히 정치적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권력 입맛에 맞는 수사결과로 검찰개혁의 표적이 됐다.
2013년 10월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59·16기)은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특별수사팀 팀장이었던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에게 외압을 통해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윤 지청장은 조 지검장에게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 청구, 공소장 변경 신청 등을 보고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외압 사실이 없다며 자신에 대한 감찰을 대검에 요청했다. 조 지검장은 대검 감찰본부가 자신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발표한 뒤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대검 감찰본부는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를 인정해 윤 지청장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을, 부팀장이던 박형철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49·25기)에 대해서는 감봉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윤 지청장에게 정직 1개월을, 박 부장검사에게 감봉 1개월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파격 인사로 12년만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급은 다시 검사장급으로 제자리를 찾았다. 윤 지검장은 국정원 사건 수사로 서울중앙지검장과 충돌해 좌천했다가 이번 인사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65·10기)가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에게 특검 수사팀장으로 합류를 요청했을 때 윤 검사는 처음에는 고사했다고 전해진다. 그런 윤 검사에게 박 특검은 "특검에 합류해 수사를 통해 명예회복을 하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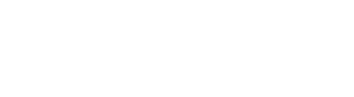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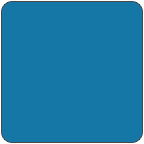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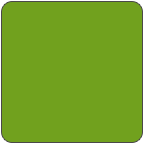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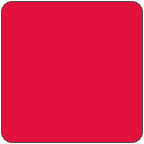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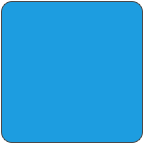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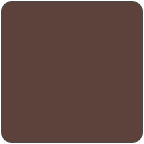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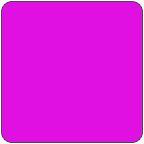

 페이스북
페이스북
 트위터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네이버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