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불암의 한가위에세이 ‘한국인의 밥상, 어머니의 맛’
최불암의 한가위에세이 ‘한국인의 밥상, 어머니의 맛’“풍류가 별건가! 달 밝은 밤, 김치에 탁배기 한 사발이면 되지” 고향의 맛, 우리 선조의 음식 문화를 찾아 전국을 누빈 지 어느덧 일 년 하고도 여덟 달이 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나를 보면 <전원일기>가 아니라 <한국인의 밥상>을 떠올린다고 하네요.
경상도 지역은 유교 문화가 발달해 종가(宗家)에서 종부(宗婦)의 손을 거쳐 전해 내려온 음식이 많았습니다. 관혼상제용 음식이 발달해 정갈한 편이지요. 전통적으로 음식을 못하는 여인은 종부가 될 수 없었다고 하네요. 충청도 음식에는 이곡(李穀)의 <차마설(借馬說)> 사상이 숨어 있습니다. <차마설>은 남의 말을 빌려 타면서 얻은 교훈을 적은 수필로 ‘빌려 탄 말이니 흠집 없이 그대로 돌려주라’는 것인데, 충청도에서는 자연 역시 빌린 것이니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사상이 음식에도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충청도 음식에는 자연에 순응하는 한편 선조의 조리법을 변형하지 않는 고집스러움이 담겨 있지요. 강원도는 산이 많아 ‘아리랑’ 노래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직접 가서 보니 집과 집 사이가 충분히 십오 리는 됨직한데, 정선의 깊은 산골로 가는 길에 할머니를 만나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물으니 “고개 너머에서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오셨느냐”고 하니까 “지팡이 짚고 오면 잠깐”이라며 웃습니다. 할머니는 동무와 밥 한 끼를 나누기 위해 고개를, 그 먼 길을 걸어온 셈이지요. 산촌인 강원도에서의 음식이 소통의 매개로 발달해 왔음을 알 수 있는 증표입니다. 정성 들여 강냉이 요리 만들어 놓고 “깡그리 만들었으니 오소” 하면 먼 길 마다치 않고 달려와 음식을 나누고, 음식을 가운데 두고 뉘 집 소가 근자에 송아지를 낳았고, 뉘 집 딸이 시집을 갔다는 둥 소통을 합니다. 우리 집 음식에도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가훈이 ‘낙이불류(樂而不流) 애이불비(哀而不悲)’입니다. ‘즐겁다고 질탕하지 말고, 슬프다고 비통해하지 마라’는 뜻인데, 이게 공자의 중용사상이지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적당히 즐기는 것이 진정 풍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 명동, 문인의 아지트였던 ‘은성’이라는 술집을 경영했던 내 어머니는 풍류를 아는 분이었습니다. 가난한 문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외상 장부에 실명 대신 ‘키다리’ ‘뿔테안경’ 등 어머니만이 알 수 있는 별칭을 적어놓은 게 기억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고 싶으면 으레 막걸리와 김치가 생각납니다. 어머니는 대학생이 된 내게 “너무 센 술은 먹지 말라”며 양주·청주·막걸리에 며칠 담가놓은 닭똥집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양주에 담가놓은 건 녹아버렸고, 막걸리 속의 것은 멀쩡했지요. 술을 마시려거든 막걸리를 마시라는 확실한 설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음식 중 나는 김치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김치를 담글 때 젓갈 대신 갖가지 제철 생선을 넣었는데, 낙지·명태·조기 등 종종 썰린 물 좋고 값싼 생선이 배춧잎 사이사이마다 듬뿍했지요. 그게 익으면 말로 설명 할 수 없는 깊은 맛이 납니다. 영양분이 부족했던 시절 어머니의 김치는 바다와 육지의 맛이 결합된 고단백 음식이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와서인지 달빛이 밝네요. 어머니 생각이 간절한 오늘 밤에는 잘 익은 김치 한 종지에 막걸리 한 잔 들이켜야겠습니다. 글·최불암/탤런트 |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기사 문화생활더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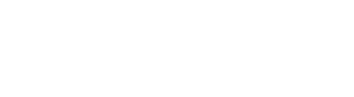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