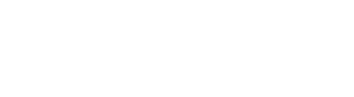情이라는 엔진으로 설설 가도 좋은 설..
情이라는 엔진으로 설설 가도 좋은 설‘명절증후군’ 앓아도 ‘새해 소망’ 전통은 변함 없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설] 설 역사와 풍속 매일이 설날만 같아라. 다들 들뜬 마음으로 설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설날 날이 밝으면 설빔을 입고 아침 일찍 집안 어르신께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주고받았다. 할아버지가 건네주는 세뱃돈은 아이들이 가장 고대하는 명절 풍속이기도 하다. 오랜 동안 민족과 함께하며 우리의 얼을 지켜온 설은 민족의 으뜸 명절로 사랑받고 있다.
2013년 설날은 2월 10일, 일요일이다. 비록 설 연휴는 예년에 비해 짧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민족 대이동 현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예상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기간 이동 인구는 2,900만여 명에 달한다. 설날의 기원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 역사서에 신라 사람들이 신년에 함께 모여 잔치를 벌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고려사>에는 설이 구대속절(九大俗節) 중 하나로 기록돼 있다. 조선시대에는 한식·단오·한가위와 함께 4대 명절로 꼽았다. 설이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 해를 탈없이 보내기 바란다는 뜻의 ‘삼간다’,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이 서럽다는 ‘섧다’, 새로운 한 해가 익숙하지 않다는 ‘낮설다’, 한 해를 새로 세운다는 ‘서다’ 등 여럿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설날의 틀은 조선 중기를 거치며 형성됐다. 조선 후기 저술인 <경도잡기>와 <열양세시기>에는 설날 세시풍속이 자세히 묘사돼 있다. 설날에는 남녀가 모두 새 옷을 입는데 이를 ‘세장’이라고 했다. 친척 어른들을 찾아가 절을 올리는 것을 ‘세배’, 시절음식으로 대접하는 것을 ‘세찬’이라고 했다. 멥쌀로 떡을 쳐 길게 늘여 가래떡을 만들었다. 이를 엽전 굵기로 잘라 넣고 끓인 떡국은 가장 보편적인 세찬이었다. <동국세시기>에는 궁중의 설 행사에 대한 기록이 있다. 궁중에서는 설이 되면 모든 대신이 대궐로 들어가 임금께 문안을 드리고 새해를 축하하는 전문(箋文)을 올렸다는 것이다. 전문은 ‘나라의 길흉이 있을 때 신하가 왕에게 올리는 글’을 말한다. 민족문화 말살 의도 일제 설 명절 훼손 설은 일제강점기 들어 수난을 당하기 시작한다.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가 설에 담겨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양력제 도입을 빌미로 설 명절을 말살하려고 한다. 새해 첫날은 설이 아니라 양력 1월 1일이라고 홍보에 나섰다. 설이면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어 차례를 방해했고, 일부러 민속놀이가 벌어지는 장소를 찾아가 다양한 방법으로 훼방을 놓고는 했다. 광복 후에도 오랫동안 설은 살아나지 않았다. 정부가 산업화에 주력하며 효율성을 강조하던 시기여서 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양력 1월 1일 신정을 쇠고 또 설을 쇨 여유가 없다는 논리였다. 신정과 설을 두 번 쇠는 이른바 ‘이중과세’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철저한 단속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설은 민족의 문화 속에서 그 뿌리를 면면히 이어왔다. 누가 금한다고 잊혀질 명절이 아니었다. 1960년대 설 사진을 살펴보면 사람들로 가득 차 터질 것 같은 귀성열차의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열차 칸에 끼어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손에는 부모님께 드릴 선물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당시 신문기사에는 나일론 양말과 양과자가 최고 인기 선물이었다.
1970년대로 넘어오면서 한국사회에 핵가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조부모를 모시고 살던 한국의 가족문화에 일대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조부모와 따로 살다 보니 명절날 온 가족이 집을 나서는 대이동 현상이 보편화하기 시작했다. 차례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사과·배 같은 전통 과일 대신 파인애플·바나나 같은 새로운 과일이 차례상에 올랐다. 부모님이 즐기던 소시지를 젯상에 올리는 것이 효인가 불효인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도 이 즈음이다. 세상은 그렇게 변해도 설날 고향을 찾는 행렬은 좀처럼 줄어들 줄 몰랐다. 1985년, 설은 ‘민속의 날’이라는 어정쩡한 이름으로 우리 앞에 돌아왔다. 단 하루뿐인 공휴일이었지만 고향을 찾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늘어만 갔다. 설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여론마저 높아지자 정부는 마침내 1989년 2월, 설을 전후한 3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60년 만에 민족의 대명절이 온전하게 복원된 것이다. 설이 공식적인 명절로 지정되면서 고향을 찾는 사람도 크게 늘었다. 전 국토가 설만 되면 귀성·귀경 행렬로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15시간이 걸렸다. 핵가족화로 ‘민족 대이동’ ‘역귀성’ 현상 1990년대 중반부터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역귀성 차량도 크게 늘었다. 1996년 도로공사 집계 자료를 보면 설기간 경부고속도로 이용차량의 37%가 서울로 향하는 차량이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설문화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속의 날에서 설로 다시 돌아왔을 당시에 비하면 훨씬 많은 사람이 집을 비우고 나왔다. 하지만 이들의 목적지는 조금씩 고향과 다른 길로 향했고, 오히려 가족으로부터 멀어졌다. 인천공항은 명절때마다 인파로 북적인다. 설이 지나면 이혼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지칭하는 ‘명절증후군’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핵가족화를 넘어 가족 전체보다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를 더 중시하는 탈가족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다. 여전히 가족이 함께 명절을 보내는 문화는 남아 있다. 하지만 요즘은 부모와 자식 2대가 사는 핵가족 형태가 일반적이다. 세배를 다니는 대신 문자나 이메일로 새해 인사를 대신하는 풍조도 일반화했다. 윷놀이도 스마트폰으로 하는 세상이 됐다. 문화가 바뀌고 가족관에도 변화가 생겼다. 변화가 빠른 한국이다. 설에 아이들이 어른들께 절하고 세뱃돈을 받던 흐뭇한 풍경도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하지만 어떤 변화가 와도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이다. 나아가 이웃을 돌아보고 한 해를 바르게 살겠다고 소망하는 일. 이것이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설의 참정신이자 후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하는 설의 미덕이다. [위클리공감] |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기사 문화생활더보기 |